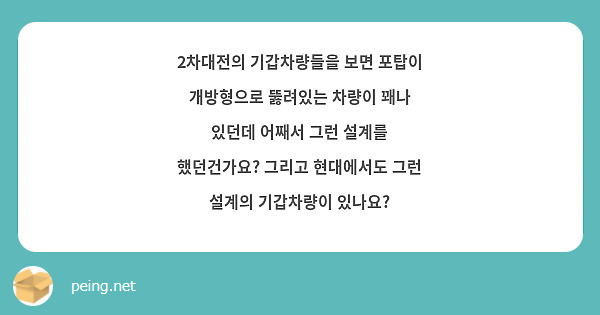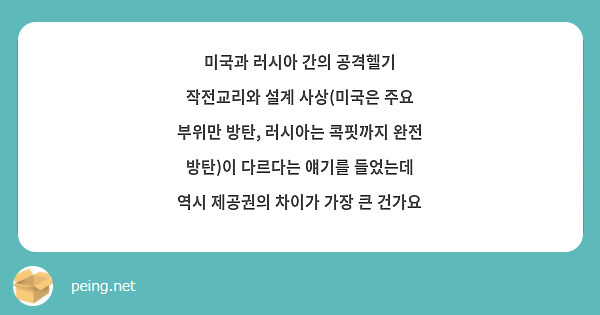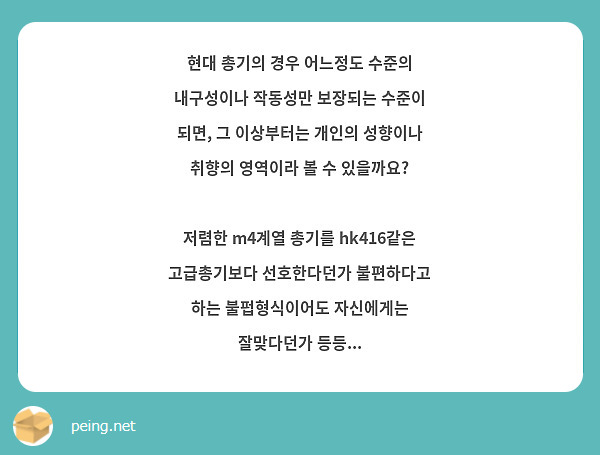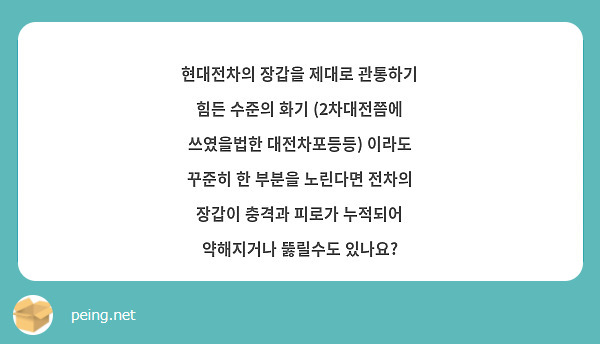여러 이유가 있는데, 보통은 무게를 줄여서 빠른 기동력을 갖추기 위한 차량들이 그런 식으로 위가 개방된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전투상황에서 적의 공격은 보통 정면장갑이나 기껏해야 측면에 집중되는 편이고, 위에서 공격이 오는 경우는 시가전을 제외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때문에 전차의 후면과 상부장갑은 장갑을 갖춘 경우에도 비교적 두께를 얇게 만드는 것으로 중량을 절약하는 공간이었고, 현재도 이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부 차량들에서는 어차피 적과 근접해서 교전하는 역할이 아닌 차량들이 장갑의 무게를 줄여서 기동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부장갑을 생략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차대전 중 많은 수의 자주포러 이유가 있는데, 보통은 무게를 줄여서 빠른 기동력을 갖추기 위한 차량들이 그런 식으로 위가 개방된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전투상황에서 적의 공격은 보통 정면장갑이나 기껏해야 측면에 집중되는 편이고, 위에서 공격이 오는 경우는 시가전을 제외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때문에 전차의 후면과 상부장갑은 장갑을 갖춘 경우에도 비교적 두께를 얇게 만드는 것으로 중량을 절약하는 공간이었고, 현재도 이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부 차량들에서는 어차피 적과 근접해서 교전하는 역할이 아닌 차량들이 장갑의 무게를 줄여서 기동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부장갑을 생략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차대전 중 많은 수의 자주곡사포 차량들이 이러했으며, 미국의 경우 대전차 자주포라는 개념으로 도입한 M10이나 M18 등도 이런 식으로 개방된 상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에서 운용한 하프트랙, 브렌건 캐리어, 그레이하운드 같은 장갑수송차량이나 정찰장갑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전차나 기갑차량들은 화력, 방어력, 기동성이 모두 줄충한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엔진기술의 한계나 병기 기술의 한계로 저 세 가지를 동시에 전부 달성하는 건 대부분 불가능하였는데(특히나 엔진의 한계로 방어력과 기동성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음), 장갑을 포기하는 대신에 기동성을 살리고자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방된 포탑은 주변에 대한 관측을 쉽게 하고, 병사들이 유사시에 더 빠르게 차량에 탑승하거나 빠져나올 수도 있어서 정찰차량이나 장갑이 약한 대신에 기동성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형태의 전차들에서는 개방형 전투실이 더 적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대에는 포탄 기술의 발달로 확산탄이나 공중폭발을 유도할 수 있어서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파편에 대한 위험성도 높고, 저격수 등에 의한 전차장이나 기관총탑의 사수가 당하는 문제가 많기도 하여 대부분의 기갑차량들이 폐쇄형 전투실과 포탑을 갖추고 있으며, M113 등과 같이 개방된 기관총탑을 갖춘 경우도 유사시에 해치를 닫고 안으로 숨을 수 있게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기동성차량에서 장갑차량으로 개조되는 경우인 장갑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는 상륙장갑차량인 AAV-7A1이 차량 후방의 수송칸 상부가 열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건 수송용으로 사용할 때 크레인 등을 사용해서 상부에서 아래쪽으로 화물을 옮기거나, 바다 위에서 AAV-7A1보다 수상에서 보통 더 높게 떠있는 선박의 갑판 등지에서 사다리를 내려 출입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상륙장갑차를 수송한 상륙함 외의 다른 선박에서도 병력이 탑승하거나 할 때 유용) LVT 시리즈 같은 2차대전기 상륙장갑차들과 그 후예들도 많은 경우 선박에서 따와서 상부가 개방된 구조였는데 AAV-7A1 같은 경우에도 지상작전시의 안전과 상륙작전 시 물자 수송 등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참과의 총기봇 2さんになんでも質問しよう!
質問
スタンプ
利用できるスタンプはありません。
スポンサーリンク
スポンサーリンク